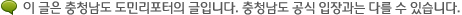
새들의 생김새는 특이하게 진화했다.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환경에 적응 한 새는 다양한 형태를 띤다. 먹이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부리들이 진화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양의 부리들도 종종있다. 이런 특징중에 주걱모양의 부리로 진화한 종이 있다. 저어새가와 노랑부리저어새가 그렇고 넓적부리도요가 그렇다. 먹이인 저서생물과 물고기를 넓은 범위에서 집기 위해 발달한 부리 형태이다. 이렇게 특이한 부리를 가진 모든새는 불행히도 모구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중 넓적부리도요는 전세계에 200마리만이 생존한 것으로 추산되는 전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새이다. 넓적부리도요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목록’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위급’ 종으로 분류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몇 년간 종을 유지할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종이다. 때문에 탐조인에게 넓적부리도요는 버킷리스트 1순위에 해당한다.
야생 조류 및 습지 트러스트(WWT)에 따르면 넓적부리도요는 지난 10여년간 90%가 사라진 종이라고 한다. 창피한 일이지만 이런 귀한 새를 만든 주범은 우리나라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원인이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매립 때문이라고 한다.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매립으로 생존의 터전이 사라지면서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과거 새만금에 상당수가 도래 했지만 현재는 극히 일부 개체(5개체 내외로 추정)가 도래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넓적한부리로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이 새는 이제 서해안 갯벌에서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같다. 수천~수만마리의 좀도요나 민물도요 사이에서 15cm내의 넓적부리도요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0마리일지라도 아직도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을 통과하여 남하하는 국제보호종이라는 것이다.

▲ 넓적부리도요
지난 10일 필자는 금강하구에서 넓적부리도요 5개체를 확인했다. 20년의 탐조활동기간 중 첫번째 관찰기록이다. 20년간 버킷리스트에 있던 종이라 아직도 흥분상태이다. 새만금과 함께 금강하구는 넓적부리도요의 마지막 서식처이다. 금강하구의 유부도를 중심으로 매년 10여개체 내에가 꾸준히 전문가들에 의해 관찰된다.
야생 조류 및 습지 트러스트(WWT)는 국제 조류보호단체들은 내버려두면 곧 절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서식처인 금강하구와 새만금은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새만금은 물막이공사 이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성이 있는 개발계획 구상이 어렵다면 새들을 위한 복원 계획을 지금 이라도 세워야 한다.

▲ 넓적부리도요가 관찰된 지점
금강하구 역시 문제가 있다. 이번에 넓적부리도요를 관찰한 지역인 솔리천 하구와 주요 서식처인 유부도는 보호지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이다.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곳에 서식하는 것이다.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이동하는 도요새들과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넓적부리도요는 극동 러시아의 툰드라 해안에서 번식하고 8000㎞ 떨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겨울을 난다. 장거리 이동의 비행의 휴게소 같은 금강하구와 새만금 등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은 넓적부리도요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위태로운 갯벌을 이제는 복원과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서천군은 넓적부리도요 서식처인 유부도를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하기위해 노력중에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앞서 새들의 서식처 보호지역 지정이 먼저란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보호지역지정도 되지 않은 유부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서천군의 발상이 영 못마땅하다.
200마리 밖에 없다는 넓적부리도요조차 보호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 자연의 이치다. 인간이 이 새의 집을 빼앗을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200마리가 20,000마리가 되는 날을 상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