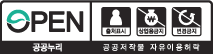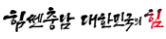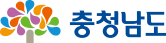천안의 구비설화 - 동남구 봉명동
2018.02.07(수) 16:38:32천안신문(icjn@hanmail.net)
천안신문은 오랜세월 천안지역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설화와 전설, 문화재, 인물, 민속과 민담, 마을유래 등 옛 조상들의 생활상이 녹아있는 각 지역별 고담을 연재해 선조들의 일상적인 문화와 삶을 엿볼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
이번 연재는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관계자들과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조사팀 협력으로 봉명동,중앙동, 일봉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입으로 구전되는 설화문학을 조사, 채록하여 발간한 '천안의 구비설화’의 저자 최상은, 김현주 교수님의 협조를 얻어 지역의 설화를 연재하게 됐다.

▲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전경
봉명동 유래
동쪽으로는 성정동과 와촌동, 서쪽으로는 쌍용동, 남쪽으로는 일봉동, 북쪽으로는 백석동에 접해 있다. 전형적인 원도심 주거지역으로 6개의 초·중·고등학교(천안봉명초등학교, 천안봉서초등학교, 천안계광중학교, 천안서여자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교육 마을이고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항선 철도가 마을 남쪽으로 관통하고 있고 수도권 전철 1호선 봉명역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봉명동 경부선 철도 천안서부역사가 인접해 있고, 동서 연결 지하차도가 개통되어 동부와 서부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로 차돌로·봉명로·성정로·백석로가 가로지르고 있고, 남북으로 봉정로·쌍용대로·서부대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한 마을이다.
또한 마을 서쪽에 위치해 있는 봉서산과 쌍용공원은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다. 봉명동에는 현재 약 8,800여 가구에 19,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점과 막거리 / 김용덕(남, 80세)

(조사자: 그게 뭐지?) (청중: 금캐는 데···.) (조사자: 아~, 네네 네.) 지금의 금광이라 그러지. (조사자: 네네, 금광.) 옛날엔 금점이라 그랬다고. (조사자: 금점~.) 금 캐는 데 보고 금전이여. (청중: 옛날에는 우리 형님께는 저것만 줏으러 다니대?) 여기가, (말소리 겹침) 여기가 천안 입장이 왜장 시대 때 노다지 나던 곳이여.
(조사자: 노다지 맞아요.) 노다지. 노다지가 나서, 어디서 금을 빻았느냐면 (말소리 겹침) 요 바로 천고 옆이 다 금 빻는 데여, 여기. (조사자: 아, 금을 빻는다고 표현하셨구나.) 그럼, 여기가 금점할 때, 금 팔 때 (조사 자: 네.)
저 저런 데서 금점에 돈 벌로 와야 되잖어? 그럼 오도가도 할데가 없응께 여기 막을 치고 살았어, 움막이랑 해가지고. (청중: 막걸 막걸리 장사하고 살았디야.) 그래서 그렇게 쪼끔씩 쪼끔씩 살던 디가 막거리여. (조사자: 막거리~!)
소학교 다니던 일제 강점기 / 노승학(남, 90세)

왜놈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왜놈들이 지독할 땐 굉~장히 지독해. (조사자: 어~.) 그렇게 교육을 잘 가르켰어.왜? 나도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가는 데 한 삼십분 늦었다고, 삼십분 을. 많이 늦었지.
왜정 때 학교 다녔으니까 한 오 리 됐어, 우리 집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삼십분 늦었는데 그리 오 리 되면 삼십분이면 충분히 올 텐데 뭘 해서 그렇게 늦었느냐, 왜놈의 선생이 우리 담임 이었었어.
(조사자: 네.) 가와바다 센세이라고. 가와바다 선생이 (일본말 발음 불명) ‘너 나오라!’ 이거야. 맨발로 운동장에 삼십 분을 세워놨어. (조사자: 어?) 그것을 교장이 알아가지고, 다 얼었지.
교장이 알아가지고서 그 왜놈의 가와바다센세이라고, 그 이튿날로 딴데로 전근 보내 버리고 말았어. 내가 저 황해도 서은군 보은면 어 심산 소학교(일본말 발음 불명)거든? 그러니까 보통학교였다? 그 다음에 심상중학교로 변했어.
그렇게 6년 동안 내가 왜놈의 학교밖에 못 나왔 어. (조사자: 네.)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배운 거 가지고 다 해먹어. 뭐, 한문도 저런 거 지금 읽을 수 있어? 노인강령? 못 못 읽는다 이거야 지금!
(조사자: 어.) 저, 중학교 나왔어도. (조사자: 네.) 나는 지금 척척 다읽는다 이거야. 지금 그쪽에 배운 거~. 근데 지금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약소국가라 왜놈들한테 침략당해 가지고서, 또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걸 우리가 어떡해.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까지 (조사 자: 네.) 잘 살고 있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식 낳으면 가르쳐야 된다 이거야. (조사자: 네.)
곡식 알갱이까지 세서 걷어간 인민군 / 김종윤 (남, 80세)

내가 지금 기억하고 참~사람이 공산당이 뭐가 나쁘냐먼 가알 왔는디 그때 가을까 인제 뭐
(조사자: 네.) 수수잎 패고 수수가 패고 호박 열고 하는데 호박을 한 포기에 몇 개가 열었나 보고 그 다음에 조사, (조사자: 음~.) 가을 가서 걷어 갈라구. 그러고 이 쑤 수수가 몇 이삭인디 요게 몇 개를 계산을 해가지고 고걸 싹 또 조사하고.
수수, 수수가 일 뭐 요거 한 이삭이 중간 잡어서 한 이삭이 몇 알갱이. (조사자: 네.) 그게 수확고 조사여. (조사자: 음~.) 그리고 요 한 평만 요게 몇 몇 이삭. 어 한 평 재가지고서 요게 몇 이삭.
(조사자: 네.) (조사 자: 음~.) 이게 이제 그 숫자가 나오잖어? (조사자: 네.) 그니까 그 몇 알갱이에 몇 이삭에 (조사자: 음~.) 이 인저 나오니까 요게 몇 평인께 얼마다고서 걷어 가, 실제로.
(조사자: 아~.) 어쨌거나 그 가을까 했으면싹 다 걷어갔지. 그거 그 나오나. 그 먹을 거나 반 주거나 말거나.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으고 참 살고 참 생생하게 우리가 적으고 알고 인자 그런 식도 인민군 시대고….
독사풀도 먹던 가난한 시절 / 이희자(여, 76세)

우리 우리 어려서는, 물론 나는 그런 생활 안 해봤지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청중: 그렇지.) 그 독사풀이라고 있어요.
독사풀을, 독사 풀이라고 이렇게 삥첨 나오는 풀이 있는디 그게 영글으면 그걸 털어다가 끼니를 연명하는 분들도 (청중: 어 어~.) 많았고, (조사자: 으음~.) 또 응? 그 보리, 보리가 이제
(청중: 보리쌀!) 노릇노릇 할 때에, 그걸 이제 비어다가 (청중: 독사풀을 먹었어.) 쪄서, 이제 쪄요. 쪄서 말려서 그걸 (발음 불명) 쪄서는 그걸로 밥을 해먹었어.(조사자: 아~.) 그런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니께···. 독사풀을 먹으면서···.
(청중: 소나무 있잖아요?) (조사자: 네!) (청중: 소나무 그거···.) 소나무 송지! (청중: 그 송골! 송골야 그걸 삐끼 가지고···.) 예, 맞아요. (청중: 송골 그거 삐끼가야가지고, 응? 그거 가지고···.) 예. (청중: 그거 쪄서 떡도 해 먹고···.) 응, 맞어. (청중: 그거 떡도 해먹었어?) 나 누렁이 떡 해먹었었잖 아.
(청중: 산에 칡 있잖아요, 칡.) (조사자: 네.) (청중: 칡 그거 캐다가 뚜드려서 물에 쪄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뭐 떡도 해먹고, 개떡도 쪄먹고 뭐, 뭐 다 해 먹고···. 칡. 옛날에요, 다 못 살아가지고 온갖 거 다 해먹고 살았어요.)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지.
(조사자: 이름이 왜 독사풀이에요?) 독사풀이 라는 풀이 있어요. (청중: 독사가 아니야, 독새풀이에요. 독새풀.) 독새.
독새 독새. (청중: 독새풀.) (조사자: 아~.) 독새풀이라고, (청중: 논에 독새풀. 논두렁이나 어디···.) 나오면은 그게 이제 여물어. 그럼, 그걸 털었 어. 털어다가 그게 씨가 있어. 그걸 다 따서 그걸로 죽 끓여서 먹는 거야.
봉사의 눈을 뜨게 한 지렁이 / 권영순(여, 84세)

옛날에 엄마가 봉사인데, 지렁이탕을···. 저기 저 아들이, 저기, 엄마가 봉사인데 아들이 일을 나가가지고 있는데 미느리가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엄마를 까 믹이고 그랬었데요.
까 믹여갖고, 그게요, 추억이돼 가고 엄마가 그거 지렁이를 자리 밑에다 옛날에는 자리 깔고 잤거 든요? 말라 놨어요, 지렁이를.
말라 놨다가 아들이 객지 나가서 들어온 뒤에, “아들아, 아들아! 우리 며느리가 이거를 해줘가고 너무너무 맛있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살도 찌고 내가 잘 살았다.” 이렁께로 아들이, “엄마! 지렁이여!”
막 그랬대. (조사자: 하하하하하!) 엄마가 눈을 딱 떴대! 봉사가, 엄마가 눈을 딱 떴대. (조사자; 아~, 우와~!) (발음 불명) 미느리가 엄마를 고쳤는 거여. 봉사를 고쳤는 거여. (청중: 심 봉사가 심청이 덕에 눈뜬 듯이 그랬구만,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