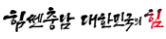연은 걸음을 멈추고 탑 하층기단의 면석에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푸른 사자 상을 가리켰다. 한 면에 세 마리씩 모두 열두 마리의 사자상이 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새겨져 있었다. 단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연이 마음을 정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부처님께 그토록 염원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
연의 입가에도 미소가 어렸다. 그러나 그다지 내키지 않는 미소였다. 단은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되었든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는 모습이었다. 극락산에서 훈훈한 바람이 몰아 내려왔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의현대사가 뒤에 서 있었다. 연은 합장을 올렸다. 단도 따라 올렸다.
“바람이 제법 훈훈하구나.”
말을 마친 의현대사는 탑을 올려다보았다. 옥개석 끝으로 푸른 하늘이 날카롭게 잘려져 있었다.
“영원함은 순간에서 비롯된 것이지. 순간은 영원함을 낳고.”
단은 의현대사의 말을 따라 푸른 하늘이 잘려진 옥개석을 올려다보았다. 연의 눈길도 그쯤으로 향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 이르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순간에 불과한 것들이야. 순간이라 이르는 것 또한 영원함을 간직한 것이고.”
의현대사는 뒷짐을 진 채 한마디 더 덧붙였다.
“이 돌과 바람처럼 말이지.”
돌의 영원성과 바람의 순간성이 모두 하나라는 얘기였다. 이것도 저것도 다름이 없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지요?”
단은 물었다. 연은 고개를 돌려 의현대사를 바라보았다. 자애로운 미소가 한없이 평온하기만 했다. 지금 이 순간 살갗으로 와 닿는 훈훈한 봄바람만 같았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지.”
의현대사의 말에 단은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의 변치 않을 마음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 물질과는 분명 다른 것이 아닐는지요?”
“다르다?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물됨과 마음가짐에 따라 변치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의 말에 의현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게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지. 그러나 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 세월이라는 놈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법을 빗겨갈 수가 없는 법이니까.”
의현대사의 말에 단은 고개를 갸웃했고 연은 아무런 말도 없었다.
“돌도 바람도 사람도 모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야. 변치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닐 테고.”
문득 바람이 풍경소리에 놀라 석탑의 옥개석을 휘돌아 쳤다. 어디선가 이른 뻐꾸기 울음소리가 보원사 앞뜰로 날아들었다.
“언제 떠나는가?”
의현대사의 물음에 단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미안함을 넘어선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다. 연 때문이리라.
“이달 보름에 떠난다 합니다.”
“일 년이 될 지, 이년 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몸조심해야 하네.”
의현대사의 눈길이 연에게로 향했다. 연에 대한 염려가 한가득했다. 피붙이 없이 어려서부터 보원사에서 자란 그녀는 의현대사를 부모로 알고 자랐다. 의현대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화창한 봄날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심이었다.
“염려 마십시오. 가량상단은 지금껏 한 번도 불미스런 일 없이 장안을 잘 다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세상구경도 할 겸 저희들 앞날을 준비할까 합니다.”
단의 말에 의현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탑을 돌아 금당으로 향했다.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걷는 모습에서 여전히 염려스럽다는 뜻이 엿보였다.
“오늘도 꽃공양을 올렸어?”
단의 물음에 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맑은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 피어올랐다.
“달리 올릴게 있어야지.”
“꽃보다 더 좋은 게 있을라고. 부처님께서도 네 마음을 아실거야.”
“대사님도 그러셨어. 쌀이니 금이니 공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이 제일 소중한 것이라고.”
“그럼, 우리 처지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걸.”
단은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연을 위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혼인도 올리지 못할 만큼 여력이 없는 처지에 쌀이니 금이니 하는 공양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서 가량상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일 년만 다녀오면 어떻게 하든 연과 혼인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상단의 일을 돕기로 했던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재기사]
- 의열단 - (16)저격수
- 의열단 (15)동지(同志)
- 의열단 (13) 원탁 밀담
- 의열단 (12) 문선식
- 의열단 (11) 대한의림부
- 의열단(10)특사 김규식
- 의열단 (9)실망
- 의열단 (8)하나의 염원
- 의열단 (7)만남
- 의열단 (6) 상해행
- 의열단 (5) 변치 않는 것
- 의열단 (4) 약산 김원봉
- 의열단 (2) 경고
- 의열단(1) 잠입
- 천명 (47·끝) 탕평책
- 천명 (46) 숙청
- 천명 (45) 자리다툼
- 천명 (44) 갈등
- 천명(43) 모략
- 천명 (42)친국(親鞠)
- 천명 (41) 의문
- 천명(40) 사상
- 천명 (39) 결단
- 천명 (38) 제사
- 천명 (37) 물거품
- 천명 (36) 논쟁
- 천명 (35) 영조의 노여움
- 천명 (34) 물거품
- 천명 (33) 투석전
- 천명(32) 패전
- 천명 (30) 요셉
- 천명 (28) 대치
- 천명 (27) 연통
- 천명 (26) 칼끝
- 천명 (25)약조
- 천명 (24)논쟁
- 천명 (23)천국
- 천명 (22) 마리아
- 천명 (21) 서신
- 천명 (20) - 밀사
- 천명 (19) 금마공소(金馬公所)
- 천명 (18) 봉칠규
- 천명 (17) 만남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5) 실토
- 천명 (14) 을선
- 천명 (13) 사미승
- 천명 (12) 용봉사
- 천명 (11) 심문
- 천명 (10) 새로운 세상
- 천명 (9) 칼
- 천명 (8) 행적
- 천명 (7) 접장
- 천명 (6) 행적
- 천명 (4) 흔적
- 천명 (3) 초검관
- 천명 (2) 시쳉
- 천명(1) 음모(陰謀)
- 미소(끝) 미륵보살
- 미소 (64) 눈물
- 미소 (63) 패전
- 미소 (62) 야차
- 미소 (61) 북쪽 성벽
- 미소 (60) 갈대
- 미소 (59) 설득
- 미소 (58) 태자 융
- 미소 (57) 한숨
- 미소 (56) 후회
- 미소 (55)배신
- 미소(54) 편지
- 미소 (53) 회유
- 미소 (52) 성벽 보수
- 미소 (51) 유혹
- 미소 (50) 신라의 퇴각
- 미소 (50) 김유신
- 미소 (48) 마지막 영웅
- 미소 (47) 불암(佛岩)
- 미소 (46) 공양
- 미소 (45) 석탑
- 미소(44) 향천사
- 미소 (43) 흰 소
- 미소 (42) 금오산
- 미소 (41) 향천사
- 미소 (40) 맹세
- 미소 (39) 환호성
- 미소 (38) 퇴각
- 미소 (37) 화살
- 미소 (36) 의기투합
- 미소 - (35) 지수신
- 미소 (34) 불타는 군량
- 미소 (33) 야습-2
- 미소 (32) 야습-1
- 미소 (31) 야차 ‘지수신’
- 미소 (30) 혈전
- 미소 (29) 김유신
- 미소(28) 별부장
- 미소 (27) 내분
- 미소 (26) 흑치상지
- 미소 (25) 삼십만 대군
- 미소 (24) 달빛속으로
- 미소 (23) 석불
- 미소 (22) 석불
- 미소 (21) 구자산
- 미소 (20) 보원사 인연
- 미소 (19) 식비루
- 미소 (18) 임존성
- 미소 (17) 신라군
- 미소 (16) 풍전등화
- 미소 (15) 월주거리
- 미소 (14) 무술경연대회
- 미소 (12) 의각대사
- 미소(11) 화문의 정체
- 미소(10) 달빛 차기
- 미소(9) 화문
- 미소(8) 함정
- 미소(7) 탈출
- 미소(6) 화문을 만나다
- 연재소설 미소 (5) 아비규환
- 미소 (4) 바다도적
- 천판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