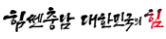‘바삭’
과줄을 베어 물면 고샅길 살얼음 밟는 소리가 난다. 기름솥에서 나온 고소한 과줄바탕에 달디단 조청과 송골송골 달라붙은 강밥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예전에는 명일 때나 해먹었지. 명일 때도 쉽게 먹을 수 있었간? 쌀이 귀했으니께” 어머니 정채분(82)씨의 말에 딸 윤광순(56)씨가 “명절이나 제사, 혼례 때가 아닌데 과줄을 해 먹으면 포도청에 불려가 곤장을 맞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라고 덧붙인다.
지금에 와서는 ‘한과’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과줄’이라고 해야 더 쉽다. 또 그래야 옛맛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예산군 덕산면 광천1리 가야산방에서는 설을 앞두고 과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쌀을 빻고, 뻥튀기하는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릴 뿐, 나머지 일들은 모두 사람 손으로 한다. 엿기름도 직접 기르고, 가마솥에 불을 때 엿을 곤다. 찹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얇게 편 과줄바탕을 아랫목에서 여러 날 말려 기름에 튀겨 내고, 거기에 조청을 발라, 강밥 입히는 일을 예닐곱 명의 할머니들이 겨우내 모여 앉아 정갈하게 해낸다.
“예전 방식대로 한거라 한과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정하고 색색깔 예쁜 모양은 안나요. 우리끼리는 ‘못난이 과자’라고도 부르죠. 그래도 드셔본 분들이 다들 ‘첫맛이 달지 않고 옛날에 먹어보던 맛’이라면서 좋아하시니 보람 있어요. 지난번 동네 향우회 때 한소쿠리 해가지고 갔더니 ‘어려서는 가난해서 먹어보지 못했던 과자’라면서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구요”
2년 전, 친정에 왔다 어머니가 만든 한과를 오랜만에 먹고는 “우리 엄마 솜씨 너무 아깝다. 나랑 작은 카페나 공방 같은 거 해볼까?”라고 무심코 한말이 씨가 됐다. 소일거리가 없어 들일에까지 매달리던 마을 할머니들에게도 희소식이 됐다. 바지런하고 손맛 좋은 어르신들의 노동력과 경험을 모으니 큰돈은 안돼도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이 됐다. 6·70대가 주축인 멤버 중 가장 젊은이는 마을 부녀회장인 신동숙(52)씨고, 가장 어른은 정채분씨다.
지난해에는 예산문화원 어르신전승사업프로그램으로 채택돼 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모두 체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경험이 스승이니 당연한건데 말이죠”
가야산방 과줄은 추석에는 만들지 않아 겨울에만 맛볼 수 있다. “첫해는 추석에도 했었는데 엿이 흘러내려 할 수가 없더라구요. 옛날에 왜 겨울에만 해먹었는지 알았어요”
가야산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따 ‘매헌과줄’이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물 좋고 산 좋은 고장에서 할머니들이 진실되게 만드니 한 번 맛보러 오셔유”
과줄을 베어 물면 고샅길 살얼음 밟는 소리가 난다. 기름솥에서 나온 고소한 과줄바탕에 달디단 조청과 송골송골 달라붙은 강밥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예전에는 명일 때나 해먹었지. 명일 때도 쉽게 먹을 수 있었간? 쌀이 귀했으니께” 어머니 정채분(82)씨의 말에 딸 윤광순(56)씨가 “명절이나 제사, 혼례 때가 아닌데 과줄을 해 먹으면 포도청에 불려가 곤장을 맞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라고 덧붙인다.
지금에 와서는 ‘한과’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과줄’이라고 해야 더 쉽다. 또 그래야 옛맛이 날 것 같기도 하고.

▲ 과줄이 탄생되려면 일주일 정도 공정을 거쳐야 한다. 반죽 발효 사흘, 바탕 말리는데 사흘, 튀기는데 또 하루가 필요하다. 여기에 엿기름을 기르고 엿을 고는 시간까지 더하면 시간은 훨씬 늘어난다. 가야산방에서는 방문객들도 하얀색 작업복에 하얀 작업모를 쓰지 않으면 작업장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정갈한 환경을 유지한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 덕산면 광천1리 가야산방에서는 설을 앞두고 과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에서는 쌀을 빻고, 뻥튀기하는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릴 뿐, 나머지 일들은 모두 사람 손으로 한다. 엿기름도 직접 기르고, 가마솥에 불을 때 엿을 곤다. 찹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얇게 편 과줄바탕을 아랫목에서 여러 날 말려 기름에 튀겨 내고, 거기에 조청을 발라, 강밥 입히는 일을 예닐곱 명의 할머니들이 겨우내 모여 앉아 정갈하게 해낸다.
“예전 방식대로 한거라 한과공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정하고 색색깔 예쁜 모양은 안나요. 우리끼리는 ‘못난이 과자’라고도 부르죠. 그래도 드셔본 분들이 다들 ‘첫맛이 달지 않고 옛날에 먹어보던 맛’이라면서 좋아하시니 보람 있어요. 지난번 동네 향우회 때 한소쿠리 해가지고 갔더니 ‘어려서는 가난해서 먹어보지 못했던 과자’라면서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구요”
2년 전, 친정에 왔다 어머니가 만든 한과를 오랜만에 먹고는 “우리 엄마 솜씨 너무 아깝다. 나랑 작은 카페나 공방 같은 거 해볼까?”라고 무심코 한말이 씨가 됐다. 소일거리가 없어 들일에까지 매달리던 마을 할머니들에게도 희소식이 됐다. 바지런하고 손맛 좋은 어르신들의 노동력과 경험을 모으니 큰돈은 안돼도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이 됐다. 6·70대가 주축인 멤버 중 가장 젊은이는 마을 부녀회장인 신동숙(52)씨고, 가장 어른은 정채분씨다.
지난해에는 예산문화원 어르신전승사업프로그램으로 채택돼 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모두 체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경험이 스승이니 당연한건데 말이죠”
가야산방 과줄은 추석에는 만들지 않아 겨울에만 맛볼 수 있다. “첫해는 추석에도 했었는데 엿이 흘러내려 할 수가 없더라구요. 옛날에 왜 겨울에만 해먹었는지 알았어요”
가야산방에서 생산된 제품은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따 ‘매헌과줄’이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물 좋고 산 좋은 고장에서 할머니들이 진실되게 만드니 한 번 맛보러 오셔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보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