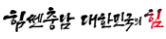“거기까지 올라왔다는 말이야?”
죽천이 놀란 목소리로 묻자 군졸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이제 코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
“이 처자들은?”
“북문 아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구한 처자들이야.”
“북문 아래서?”
북문 아래라는 말에 군졸은 깜짝 놀란 얼굴로 다시 연과 초림을 훑어보았다.
“그래, 그러니 코앞이라고 한 거지.”
“그렇구먼, 하튼 내일이면 무슨 결판이 나도 나겠지.”
군졸은 한 숨 반, 다짐 반으로 그렇게 중얼거려댔다.
“많이 들게.”
“자네도 한 술 떠야하지 않는가?”
“난 조금 있다가. 우선 이 처자들부터 안내하고.”
말을 마친 죽천은 그제야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듯 연과 초림을 돌아보았다.
“처자들도 한 술 떠야지요? 예까지 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죽천의 따뜻한 말에 초림이 촐싹거리며 나섰다.
“고맙습니다. 엊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죽천은 빙긋이 웃으며 밥과 국을 뜨고 있던 아낙에게 연과 초림을 소개했다.
“이 처자들도 임존성을 찾아온 백제 백성들입니다. 따뜻한 국과 밥을 좀 주시고 이곳에서 일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
죽천의 말에 아낙은 고개를 들어 연과 초림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위 아래로 훑어보다가는 물었다.
“어디서들 왔어?”
아낙의 물음에 연이 대답했다.
“저희들은 가량협에서 왔습니다.”
“가량협이라면, 보원사?”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낙은 허리를 펴고는 다시 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얼굴이 낯이 익은데?”
“예. 저는 보원사 요사채에서 일을 보고 있던 연이라고 합니다.”
그제야 아낙은 무릎까지 쳐대며 반가운 소리로 호들갑을 떨어댔다.
“맞아. 그래서 낯이 익었군 그래. 나는 마시산군에 살고 있었는데 보원사에는 일 년에 서너 차례씩 꼭 들르곤 했지. 그래서 낯이 익었던 게야.”
아낙은 호들갑 끝에 간드러진 웃음까지 묻혀냈다. 연은 더욱 마음이 놓였다. 가슴도 따뜻해졌다.
“그러세요. 마시산군이라면 가량협에서 지척인데.”
“그럼,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초파일이다 우란분절이다 부리나케 다니곤 했지. 그나저나 의현대사께서는 어떻게 되셨어?”
연이 머뭇거리자 초림이 나섰다.
“그냥 보원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사님께서는 워낙 큰스님이시다 보니까 신라 놈들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림의 말에 아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테지. 그것만도 다행이야. 대사님만 무사하시다면야 보원사는 별일 없겠지 뭐.”
아낙과 초림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연은 가슴이 찔렸다. 어려서부터 키워준 은혜도 저버린 채 저 혼자 살고자 부처바위 뒤에 숨고 또 그것도 모자라 밤에 몰래 도망쳐 가야산을 넘었으니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부끄럽고 또 부끄럽기만 했던 것이다.
“잘 들 왔어. 예서 난리가 가라앉으면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풍달군장님께서 내일 저 떼놈들과 신라 도둑놈들을 죄다 쓸어버리실 테니까.”
초림은 아낙의 말을 환한 웃음으로 맞받았다.
“여기서 밥 짓고 음식을 하다 어려우면 저기 막사에 가서 좀 쉬면 돼. 워낙 많은 양이다보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백제를 지키기 위한 일인데, 이 정도 어려움은 감내해야 한다고.”
“아무렴요. 그렇고말고요. 그게 다 우리 백제를 위한 일인데요.”
초림도 어느새 아낙과 같은 빛깔이 되어 있었다. 연은 부끄러운 자신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백제도 의현대사도 연의 가슴 속에는 그저 작은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연의 가슴 속에는 오직 단의 생각뿐이었던 것이다.
“처자는 기운이 없어 보여. 빨리 이 따뜻한 국에 밥 말아먹고 기운 차려. 그래야 일을 하지.”
아낙의 말에 초림이 또 나섰다.
“연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배가 등짝에 가 붙어 있을 거라고요.”
초림의 해맑은 웃음에 연도 빙그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연과 초림은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먹고는 지친 몸을 막사에서 쉬었다. 밖에는 밤새 군사들의 오가는 소리와 점호소리로 시끄러웠다.
밤이 깊어서야 연과 초림은 잠에 들 수 있었다. 지친 몸이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재기사]
- 의열단 - (16)저격수
- 의열단 (15)동지(同志)
- 의열단 (13) 원탁 밀담
- 의열단 (12) 문선식
- 의열단 (11) 대한의림부
- 의열단(10)특사 김규식
- 의열단 (9)실망
- 의열단 (8)하나의 염원
- 의열단 (7)만남
- 의열단 (6) 상해행
- 의열단 (5) 변치 않는 것
- 의열단 (4) 약산 김원봉
- 의열단 (2) 경고
- 의열단(1) 잠입
- 천명 (47·끝) 탕평책
- 천명 (46) 숙청
- 천명 (45) 자리다툼
- 천명 (44) 갈등
- 천명(43) 모략
- 천명 (42)친국(親鞠)
- 천명 (41) 의문
- 천명(40) 사상
- 천명 (39) 결단
- 천명 (38) 제사
- 천명 (37) 물거품
- 천명 (36) 논쟁
- 천명 (35) 영조의 노여움
- 천명 (34) 물거품
- 천명 (33) 투석전
- 천명(32) 패전
- 천명 (30) 요셉
- 천명 (28) 대치
- 천명 (27) 연통
- 천명 (26) 칼끝
- 천명 (25)약조
- 천명 (24)논쟁
- 천명 (23)천국
- 천명 (22) 마리아
- 천명 (21) 서신
- 천명 (20) - 밀사
- 천명 (19) 금마공소(金馬公所)
- 천명 (18) 봉칠규
- 천명 (17) 만남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5) 실토
- 천명 (14) 을선
- 천명 (13) 사미승
- 천명 (12) 용봉사
- 천명 (11) 심문
- 천명 (10) 새로운 세상
- 천명 (9) 칼
- 천명 (8) 행적
- 천명 (7) 접장
- 천명 (6) 행적
- 천명 (4) 흔적
- 천명 (3) 초검관
- 천명 (2) 시쳉
- 천명(1) 음모(陰謀)
- 미소(끝) 미륵보살
- 미소 (64) 눈물
- 미소 (63) 패전
- 미소 (62) 야차
- 미소 (61) 북쪽 성벽
- 미소 (60) 갈대
- 미소 (59) 설득
- 미소 (58) 태자 융
- 미소 (57) 한숨
- 미소 (56) 후회
- 미소 (55)배신
- 미소(54) 편지
- 미소 (53) 회유
- 미소 (52) 성벽 보수
- 미소 (51) 유혹
- 미소 (50) 신라의 퇴각
- 미소 (50) 김유신
- 미소 (48) 마지막 영웅
- 미소 (47) 불암(佛岩)
- 미소 (46) 공양
- 미소 (45) 석탑
- 미소(44) 향천사
- 미소 (43) 흰 소
- 미소 (42) 금오산
- 미소 (41) 향천사
- 미소 (40) 맹세
- 미소 (39) 환호성
- 미소 (38) 퇴각
- 미소 (37) 화살
- 미소 (36) 의기투합
- 미소 - (35) 지수신
- 미소 (34) 불타는 군량
- 미소 (33) 야습-2
- 미소 (32) 야습-1
- 미소 (31) 야차 ‘지수신’
- 미소 (30) 혈전
- 미소 (29) 김유신
- 미소(28) 별부장
- 미소 (27) 내분
- 미소 (26) 흑치상지
- 미소 (25) 삼십만 대군
- 미소 (24) 달빛속으로
- 미소 (23) 석불
- 미소 (22) 석불
- 미소 (21) 구자산
- 미소 (20) 보원사 인연
- 미소 (19) 식비루
- 미소 (18) 임존성
- 미소 (17) 신라군
- 미소 (16) 풍전등화
- 미소 (15) 월주거리
- 미소 (14) 무술경연대회
- 미소 (12) 의각대사
- 미소(11) 화문의 정체
- 미소(10) 달빛 차기
- 미소(9) 화문
- 미소(8) 함정
- 미소(7) 탈출
- 미소(6) 화문을 만나다
- 연재소설 미소 (5) 아비규환
- 미소 (4) 바다도적
- 천판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