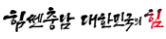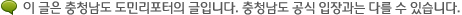
아내의 손길이 부산하다. 도시락에 밥을 담더니 이번엔 반찬통에 김치를 넣는다. 서비스라며 달걀부침까지 그 위에 얹었다. 이제 내 몫이다.
아내가 정성으로 싸준 도시락을 가방에 챙긴다. 1회용 봉지커피도 서너 개는 넣어야 한다. 그래야 야근할 때 쏟아지는 졸음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가방의 지퍼를 닫은 뒤 옷을 갈아입고 일어섰다.
“다녀올 게.” “그려, 잘 댕겨 와.” 내가 야근을 하는 오늘밤과 내일 새벽까지도 가련한 아내는 다시금 독수공방의 과부 아닌 과부 신세를 못 면할 터이다. 그 지독했던 강추위의 겨울이 겨우 물러가긴 했지만 지금도 밤은 뱀의 꼬리처럼 여전히 길기만 하다.
따라서 오후 4시에 집을 나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내일 오전 8시까지의 16시간 가량 아내는 다시금 혼자서 외로이 집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뿐이랴.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늘 약으로 사는 아낙인 터여서 새벽엔 또 무시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저리고 아프다는 두 다리를 마사지해 주면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웃을 수도 있을 내 사랑하는 조강지처. 하지만 먹고사는 게 뭔지 나는 또 다시 이틀 건너 조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야근을 맞았다.
지금 시간은 날이 바뀐 새벽 4시하고도 5분. 아직도 퇴근을 하자면 3시간 이상이 남았다. 그렇지만 문제 없다. 16시간 중에서 벌써 13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다면 4분의 1도 채 안 남은 셈이므로.
회사 건물의 보안(保安)을 책임지는 경비원의 일을 시작한 건 작년부터이다. 처음엔 다소 종작없이 서툴렀지만 이젠 적응이 되어 할 만 하다. 같이 근무하는 이들도 다들 순박한 편이라 벌써 내 마음까지를 얼추 줘버렸다.
경비원을 직업으로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뭐니 뭐니 해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나이 어린 고객과 직원에게까지도 꼬박꼬박 거수경례를 붙여야 하며, 귀와 손이 떨어질 것만 같은 엄동설한에도 밖에 나가 물에 빠진 개 떨 듯 하던 때 날 가장 괴롭힌 건 ‘이거 안 하면 밥 굶어죽나?’라는 자문자답이었다.
그런데 답은 쉬 도출되었다. #천한백옥 (天寒白屋)의 명실상부한 서민이었기에 이마저도 안 한다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바라지에도 차질이 올 건 뻔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 아니었던가!’ 따라서 그 빚을 갚자면 경비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직업도 마다할 처지와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여간 그 덕분에 사랑하는 딸도 지난 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오빠에 이어 올 3월부턴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노력과 고생 끝엔 고진감래라는 종착역이 있어야 마땅하다.
무수한 잡초와도 같이 무시로 살갗까지를 상처 냈던 지난(至難)한 지난날을 되돌아본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견지할 것은 역시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일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잠시 후면 다시 또 새아침의 여명(黎明)이 꾸벅 인사를 하며 다가오리라.
#천한백옥(天寒白屋) = 추운 날의 허술한 초가집이라는 뜻으로, 엄동설한에 떠는 가난한 생활을 이르는 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홍경석님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