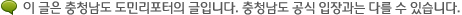‘공주봉현리상여소리’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상여소리입니다.
상여는 고인을 염습 한 뒤 장지까지 모시고 간 ‘망자의 가마’였죠. 운구차가 모시고 가는 지금과 달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장례문화였습니다.
공주봉현리상여소리는 일명 ‘달공소리’라고도 부릅니다. 달공소리는 봉현리상여소리의 일부분인데 상여가 장지에 도착해 고인을 땅에 묻고 흙을 덮는 과정에서 가래질을 하며 다같이 소리를 내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는 공주에서 서쪽 20km지점에 위치한 산골마을입니다. 추정키로는 백제시대부터 촌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상 차령산맥 자락에 위치한 교통의 오지로 타 지역과의 교류가 적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밤 농사를 많이 지어 오래전부터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골마을의 특성상 두레와 관련된 자리개질소리, 모방구치는소리 등의 농요와 토속적 체취가 배인 민요 등이 전래되어 불려지고 있는 서정적이며 향토적인 마을입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조선조 관찰사가 주재하던 충청도 행정의 중심지로서 유학을 숭상하는 동방예의지국의 기풍과 관혼상제의 예를 중요시하는 양반고장의 전통으로 인하여 상례가 발달하였으며, 충청도 관찰사가 육성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역담여가가 공주시에 전래되어왔습니다.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드물게 명맥을 이어오면서 장례를 치를때 행해져 오던 상여소리를 1994년 12월에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김원중, 박관봉, 차기두씨 등 마을 노인들이 본격적으로 채록하기 시작하였답니다.
마을에서 현대적인 장례의식을 치르기 전까지 마을사람의 장례때 꾸준히 상여가 나가던 것을 체계화 하여 1997년 12월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 하였고 현재 임동규 선생님께서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계시며 봉현상례소리보존회에서 보존 전승하고 있습니다.
1996년 제3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특히 청양군 목면 안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이 경계면에 조선시대 항일 순국지사이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사우인 모덕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봉현리 상여소리도 최익현 선생의 순국 당시 장례를 치렀던 것을 모태로 해서 재구성한것이라 합니다.

▲ 장지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여

▲ 상주와 가족, 문상객 등이 함께 상여 앞에서 모여 제를 지냄

▲ 고인께 상여가 나감을 고함

▲ 상여가 나갈 채비를 하시는 선수부 요령잡이이자 선소리를 담당하시는 공주봉현리상여소리 무형문화재 제23호 전수조교이신 임동규 선생님

▲ 상여를 바라보는 유가족. 이거 행사인데도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십니다. 연기 몰입...

▲ 자, 이제 상주에게 인사를 고하고 떠날 차례입니다.

▲ 상여가 나갑니다

▲ 상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선조들의 외나무다리 혹은 좁은 논두렁을 통과하는 상여의 과학적인 모습입니다.

▲ 가로 폭 2미터 정도의 2줄의 상여꾼들이 폭 50cm안팎의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양쪽에서 다리를 모아 지나는 이 과학적인 방법을 보세요.

▲ 좁은 논두렁을 무사히 통과.

▲ 평지로 나와서 평화롭게 행진

▲ 상여를 인도하는 선수부 임동규 선생님의 구성지고 애절한 선소리가 장지를 압도합니다.

▲ 여의주를 문 네 마리 용이 승천하듯 앉아 있는 모습

▲ 상여를 이끄는 볏짚 탈의 상여꾼

그리고 봉현리 상례는 충청남도에서 사용된 볏짚 탈과 탈춤, 운삽불삽 등이 그대로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봉현리의 상여는 일반적인 연봉(蓮逢)상여나 여의주(如意珠)상여와 달리 위에 날개를 편 봉황이 앉아 있고, 네 귀에는 여의주를 문 네 마리 용이 승천하듯 앉아 있으며, 용과 봉황 위에 다른 장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승사자, 신선, 연꽃 등 불교나 무속적 요인을 배제하고 상여의 품격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며, 화려한 봉황의 머리만을 조각하여 네 귀와 양면에 꽂고 난간을 고정하는 꽂이 역시, 봉황의 머리로만 장식하여 상단에 날개를 편 봉황을 빛나게 하였다. 이는 봉현리(鳳峴里), 사룡동(四龍洞), 용치(龍峙), 봉재 등의 마을 명칭에 따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상여의 구성은 요령잡이 2명(앞수부와 뒷수부)과 상여의 크기에 따라 담여꾼 12명, 16명, 32명으로 구성됩니다.
형식은 담여꾼과 요령잡이의 앞뒤 2개조로 나누어 선소리와 후렴을 교대로 시행합니다.
2개조로 나눈 이유는 전통사회에서 상여의 행상 거리가 멀 경우 담여꾼들(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담여 작업과 만가를 부르는 행위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가를 부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담여꾼과 요령잡이를 2개조로 나누어 선소리와 후렴을 각각 1회씩 교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 어르신들만으로 구성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상여를 메고 갑니다
소리의 경우 발인, 하직인사, 메김소리와 후렴을 함께는데 이는 충청도 사투리의 처량하고 긴 진소리, 잦은소리, 에랑얼싸, 회심곡조, 겹소리 이렇게 8가지로 나뉩니다.
홑소리 만가는 상여가 출발하기 전에 마당에서 부르는 인사소리, 동구 밖까지 천천히 부르는 늦은소리, 속도를 빨리 갈 때의 잦은소리, 외나무 다리나 징검다리를 건널 때 부르는 에랑얼싸, 비탈 심한 언적이나 산을 오를 때 부르는 어이차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중 회심곡조가 아주 적고 민요조의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이라고 하네요.

▲ 무형문화재 23호 전수조교이신 임동규 선생님께서 봉현리 상여소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봉현리상여소리 전수관

▲ 봉현리상여소리중 하나인 달공소리 깃발
봉현리 상여소리를 취재하고 돌아 나오면서 문득...
어릴적 멀리 떠나는 망자의 혼을 달래며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던 상여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에헤~ 에헤~ 어허넘차 어허~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임을 두고서 나는 간다/ (뒤) 인제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주오/ (앞) 북망산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가 북망이라/ (뒤) 우리가 살며는 몇 천년 사나요, 살어서 생전이 맘대루 놀자/ (앞)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구서 웃지를 마라/ (뒤) 세모래 강변에 종달새는 천장 만장 구만장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