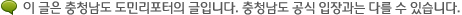
할인 마트에서였다. 채소 몇 가지를 사려고 모 대형마트에 들른 날.
몇 코너를 구경삼아 돌다가 포장식품코너를 지나가게 되었다. 한 식품회사에서 신제품 쌀 고추장 홍보판촉행사를 하고 있었다. 식품회사로는 후발사인 것 같았다. 여느 행사장에서 보는 홍보원처럼 열중인 그 회사직원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임이 분명했고,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다. 국산 쌀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이외에는 구경하는 사람이 없었다. 몇 개의 제품단위 중에서 2kg짜리가 특히 내 눈에 들어왔는데, 행사기간동안 무려 40%나 할인하고 있었다. 쌀이 주원료라 탄력이 좋고, 투명해서 빨간색이 선명했다.
나는 진짜 국산쌀이냐, 수입쌀은 아니냐, 별 뜻은 없이 몇 가지를 물어보고 집에 고추장이 얼마나 남았나 떠올려보았다. 통 바닥이 보이는 지점까지 내려가 있었다. 한 통 사고 싶었다. 그런데 2kg짜리를 손에 들어 보니까 아주 무거웠다. 채소 몇 가지 살 생각이라 카트를 들지 않고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것이 걸렸다. 고추장이 들어가면 바구니는 무거워질텐데,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른 코너를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망설여졌다.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바구니 차림이라 카트로 바꾸어 와야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자기가 가져다주겠다고 하면서 냉큼 몸을 돌렸다. 너무 빨리 입구 쪽으로 뛰어 가는 바람에 말릴 틈이 없었다. 나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성정이 아니라 좀 불편한 심정으로 서 있었다.
금세 카트를 밀고 왔다. 실적을 올리려는 그녀의 열심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않았다. 카트를 갖다주는 서비스까지 안 해도 나는 살 생각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고추장 외에 샘플도 여러 개 넣어 주면서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양손을 앞에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물론 웃기도 했다. 그런데 웃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있었다. 그 굳음이 마음에 걸렸다.
몇 코너를 더 돌고 그날의 목적인 채소들을 사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한참 지난 뒤에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다. 카트를 카트 정리대에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이었다. 계산대 근처에 그냥 두고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평소의 나답지 않는 행동이었다. 지금까지 카트를 쓰고 반납대에 끼워놓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내 손으로 가지고 들어간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의무감이 없었던 것이다. 이어서 나는 “앗 100원!” 낮게 외쳤다. 어쩌지?
대형 수퍼의 카트 정리대에서 카트를 빼낼 때는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넣게 되어있다. 그리고 갖다 둘 때는 100원을 빼낸다. 홍보직원은 카트를 가져오면서 자기돈 100원 넣었을 것이다. 나는 카트를 계산대 근처 어딘가에 두고 왔고, 100원 짜리는 제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었다. 그때 생각났다. 그녀의 웃음이 왜 굳었었는지. 고추장 코너를 떠날 때 나는 그녀에게 100원을 주었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100원에 대한 인사말은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카트와 100원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았었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100원을 달라고 할까 하다가 차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 100원은 돈 축에 들지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또는 그까짓 100원을 뭘 달라고 하느냐고 내 쪽에서 타박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카트를 가지고 나가서 100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카트를 대령해주는 서비스까지 했는데 100원까지 먹어버리는 내가 얄미웠을지도 모른다. 엄연히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은 장사의 비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생존의 고단한 투쟁에 나선 사람의 인고를 되새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의 이러한 전개는 너무 지나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100원에 대해 금방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금방 잊혀지지 않았다. 마음이 돌덩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미안했다. 한 편으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돈을 가지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오인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날카로워져갔다. 카트를 반납대에 가져가기만 했어도 나는 100원을 꺼냈을 것이고, 그녀에게 돌려주었을 것이다. 왜 카트반납을 잊어버렸을까. 그녀와 나는 서로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실상 그리 좋지 않았다.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마트에 전화를 걸어 그녀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사실을 말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고, 퇴근했을 것 같았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퇴근하고 없으면 그 회사에 전해달라고 해보자. 너무 번거로웠다. 그만 두었다. 번거롭기 때문이기보다는 100원이라는 돈이 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면서 되뇌었다. 나는 그 돈을 가지지 않았다.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주는가.
2주일이 지났다. 그때까지도 마음 한 곳은 편하지 않은 채로 있었다. 100원의 힘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