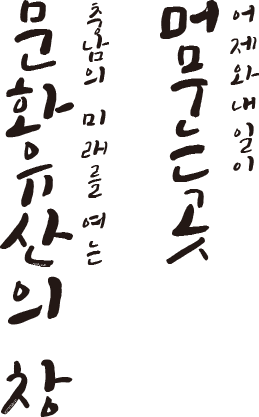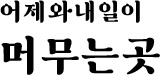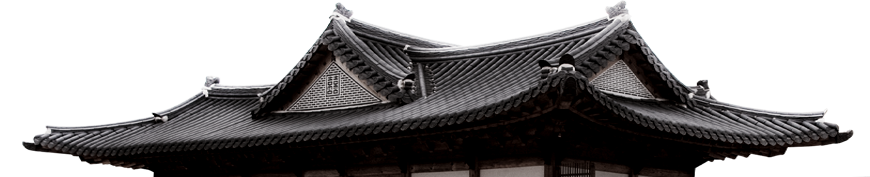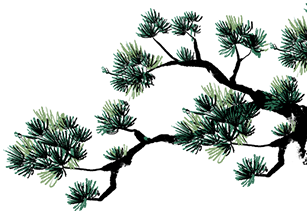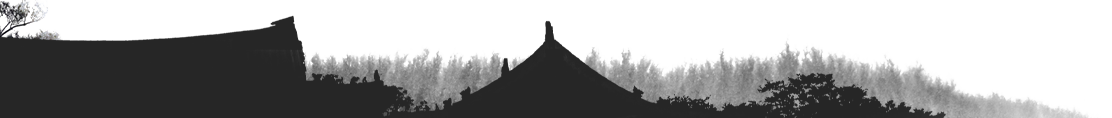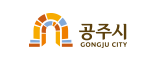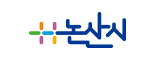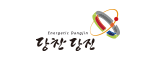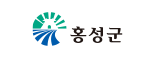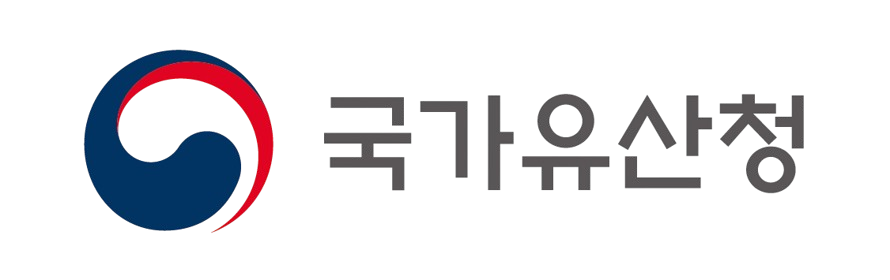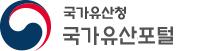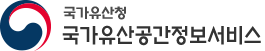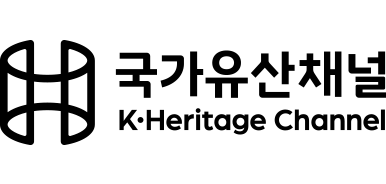-
보령 학성리 공룡발자국화석
기념물보령 학성리 공룡발자국화석
-
보령 산수동 소나무
기념물보령 산수동 소나무
조선초기의 명장으로 북방의 여진을 정벌하고 이기애의 난을 평정한 신천 부원군인 강순(康純, 1390~1468)장군이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를 둘러 보고 산수동소나무를 식재했다고 전해지고 있음. ◦ 둘레가 270㎝, 지상 70㎝ 높이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동쪽으로 8~9m 뻗어 나갔으며 그 높이가 170~230㎝인 산수동 소나무가 있는 이 마을에서는 예부터 영험이 깃든 소나무로 알려져 나무 앞에서 정성껏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고 이 나무에 해를 끼치거나 가지를 꺾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전하고 있음.
-
보령장현리귀학송
기념물보령장현리귀학송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 이산해의 동생이며, 토정 이지함의 조카인 동계(東溪) 이산광(李山光, 1550~1624)이 광해군의 정치에 회의를 느껴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며, 시와 글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지은 정자가 귀학정(歸鶴亭)이었음. ◦ 이후 이 곳에는 이산광의 후손들이 세거하여 왔고, 그의 6대손인 이실(李實, 1777~1841)이 소나무를 심었는데, 서로 다른 뿌리에 6가지로 뻗은 수형의 소나무로 성장하여 현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귀학송(歸鶴松) 또는 육소나무로 불리기도 함.
-
낙화암
문화유산자료낙화암
백제 700년 사직이 무너지던 날 의자왕의 궁녀들이 “차라리 자결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하고 이곳에 이르러 강물에 몸을 던져 원혼을 묻었다고 전하는 곳이다.
-
천정대
기념물천정대
범바위(호암)라고 부르는 호랑이 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부근 동북편에 임금바위, 신하바위로 불리는 바위들이 있으며 이곳이 천정대임. 백제시대에 재상을 선출하던 곳
-
노성궐리사
기념물노성궐리사
공부자가 생장한 마을이 궐리촌이라는 데서 유래된 명칭으로 공자의 유상을 봉안한 영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 기와집, 우리나라의 궐리사는 강릉, 제천, 화성에 있었으나 현재는 이곳과 화성만 존재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 불상 일괄
보물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 불상 일괄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扶餘 無量寺 五層石塔 出土 金銅佛像 一括)’은 무량사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1구)과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3구)로서,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1구는 고려시대의 금동보살좌상이며, 3구는 조선 초기의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좌협시(左脇侍) 관음보살상과 우협시(右脇侍) 지장보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량사 오층석탑은 중량감 넘치는 형태미를 자랑하는 고려 전기에 제작된 석탑이다. 석탑의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상들로, 탑의 초창 및 중수 연대를 추정에 중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 준다. 2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한 고려 전‧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아미타여래삼존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유행한 관음(觀音)과 지장(地藏)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 도상을 형성한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이 삼존(三尊)은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 신앙 및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구성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도 크며 상태도 양호하다.
-
계유명삼존천불비상
국보계유명삼존천불비상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서광암(瑞光庵)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비석 모양의 돌에 불상과 글을 새겨 놓은 것이다. 사각형의 돌 전체에 불상을 새겼는데, 앞면의 삼존불(三尊佛)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글이 새겨져 있고, 그 나머지 면에는 작은 불상을 가득 새겨 놓았다. 삼존불은 연꽃무늬가 새겨진 반원형의 기단 위에 조각되어 있는데, 4각형의 대좌(臺座)에 앉아 있는 중앙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양 옆에 협시보살이 서 있는 모습이다. 본존불은 옷을 양 어깨에 걸쳐 입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체가 많이 닳아서 세부 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 특징적인 것은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이 무릎 아래로 길게 흘러 내려와 대좌까지 덮고 있다는 점이다. 양 옆의 협시보살도 손상이 많아 세부 모습을 살피기는 어렵지만, 무릎 부분에서 옷자락이 X자형으로 교차되고 있어 삼국시대 보살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상들의 머리 주위에는 연꽃무늬와 불꽃무늬가 조각된 머리광배가 다른 부분에 비해 파손이 덜 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삼존불상 외에도 사각형의 돌 전체에 일정한 크기의 작은 불상들이 규칙적으로 새겨져 있는데, 깨진 부분에 있었을 불상들까지 감안한다면 천불(千佛)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다. 이들 작은 불상들은 모두 머리광배를 지니고 있으며, 옷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다.
-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
국가등록문화유산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