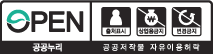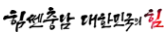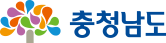유관순의 이화학당 선배 김복희, 서울 독립만세운동 백암리에 전파 ▲ 김복희 ▲ 출옥 후에 발한 어떤 여학생의 편지 <신한민보 1919년 9월 25일> ▲ 김복희(오른쪽 끝)의 가족들 ▲ 구미동 마을과 방화산 정상
[편집자註] 이 연재물은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아산기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해 김일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천경석 온양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위원이 취재·집필해 ‘아산지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학술조사용역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 것을 일부 여약한 것입니다.
3월 31일을 시작으로 아산 일대에서 봉화시위가 들불처럼 퍼져 나갈 때 염치면 백암리(白岩里)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봉화를 피우고 마을 뒷에 있는 방화산에서 산상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유관순과 같이 이화학당에 다녔던 김복희(金福熙)와 김복희가 이화학당에 가기 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영신학교(永新學校) 여교사 한연순(韓連順)이 주도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만세시위는 주도자들의 자세한 이야기가 남아 있지 않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행히 김복희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18세 어린 소녀가 어떻게 만세시위를 주도하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됐다.
김복희의 이야기는 김복희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교육 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당시의 김복희나 유관순 같은 십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식민지 교육에 물들지 않고 민족정신을 갖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독립운동에 나서게 됐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화학당 학생 김복희와 백암리 만세시위

김복희는 1901년 11월 30일(음력 10월 20일) 이순신의 고택과 현충사 인근 백암리 구미동에서 아버지 김윤필(金允弼)과 어머니 박씨 사이에 태어났다. 위로 오빠 김주영, 아래로 여동생 복례의 3남매 중 장녀였다.
약 50호 되는 구미동 마을은 대지주의 땅이 많았는데, 지주들은 현지에 ‘마름’이라 부르는 소작지 관리인을 두고 소작인들에게 가을에 수확물의 일정한 비율을 소작료로 거두어 들였다.
당시에는 대개 병작반수(竝作半收)라 해서 지주가 수확의 절반을 가져가나 악덕 지주들은 6~7할 이상을 가혹하게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
1901년경 지주 장지순의 소작지 마름으로 인천에서 최봉현이란 사람이 왔다. 마름 최봉현은 기독교 감리회 인천 내리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다.
최봉현은 아산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보며, 이웃들에게도 전도했다. 구미동 마을에는 불과 3개월 만에 70여 명의 신자가 생겼다. 소작을 주었다 빼앗았다 할 수 있는 마름의 권한 때문에 마름의 종교를 받아들인 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한국의 정치는 불안했고, 외세의 침략과 청·일간, 러·일간의 전쟁 또는 전쟁의 소문이 도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았던지라, 생명보전과 안전을 위해 힘있는 서양 국가의 종교에 의지하려는 국민들이 많아 기독교가 급속히 확장됐던 때와 맞물려 있었다.
그 결과 얼마 후에는 구미동 이웃 마을에도 구미동만큼의 신자가 생겼다. 구미동에는 아산 최초 개신교 교회인 백암교회가 세워졌고, 백암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 다른 마을 사람들은 ‘예수교인 마을’이라 불렀고, 술 담배 못하는 사람을 보면, ‘구미동 사람’이라며 놀렸다.
김복희는 백암교회 안에 설립된 ‘영신학교’에서 공부했다. 당시 백암교회는 공주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런 외국인 선교사 중에 이름이 앨리스 제이 햄몬드 샤프(Alice J. Hammond Sharp)이며 사람들이 사애리시(史愛理施), 또는 ‘사부인’이라 불렀던 여성 선교사가 있었다.
여성교육에 큰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샤프의 눈에 총명한 김복희가 띄었다. 샤프 여사는 김복희가 영신학교를 졸업하자 서울의 이화학당에 추천해 4년제 보통과의 4학년에 편입하게 했다.
보통과를 마친 김복희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다. 김복희는 1902년생인 유관순보다 1살 위이며, 학년으로서는 이화학당 2년 선배였다. 3ㆍ1운동 때 유관순이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이었는데, 김복희는 졸업이 한 달도 못남은(1919년 3월 말에 졸업) 3학년이었다.
3ㆍ1운동이 일어난 것은 김복희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으로서 졸업식을 앞둔 시점이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서울 4대문 안 전역에서 벌어졌다. 시위학생들은 덕수궁 뒤에 있는 이화학당 앞에 와서 이화학당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학생들이 교문으로 달려 나갔다.
시위가 격화되자 총독부는 휴교령을 내렸다. 기숙사에 있던 지방 학생들은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 3월 13일 김복희는 기차를 타고 천안역에 내려 고향 백암리로 돌아왔다.
김복희는 영신학교 교사인 한연순을 만나 서울에서 있었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운동을 이야기하고, 백암리에서도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킬 결심을 말했다. 이에 한연순 선생도 뜻을 같이 했다.
둘은 김상철 같은 동네유지들과 만나 만세운동을 의논했다. 3월 31일 밤으로 날을 정했다. 그날 밤 모든 동리민들이 횃불을 들고 동리에서 가장 높은 방화산 꼭대기에 모였다. 산상 봉화시위가 아산 일대에 퍼지던 때였다.
산정에 모인 약 50여명의 주민 중 여자는 김복희와 한연순 뿐이었다. 주민들은 봉화를 피워놓고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시위소식이 알려지자 온양 온천리 헌병분견대 헌병들이 총을 쏘며 올라왔다. 주민 모두 헌병들에게 해산돼 대부분 잡혀 갔다.
시위를 주도했던 김복희와 한연순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헌병을 피해 산을 타고 내려오다 낭떠러지 밑 돌밭에 떨어져 둘 다 큰 부상을 입었다. 김복희는 특히 얼굴을 다쳐 피투성이가 됐다. 한연순은 부상이 심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헌병들은 만세시위의 주도자가 김복희와 한연순인 것을 알고, 두 사람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 온양 헌병대분견소로 끌고 갔다. 두 사람은 온양헌병대에서 걸어서 천안역으로 압송됐다. 두 사람은 천안역에서 기차로 조치원에 도착해 헌병대 유치장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다음날 공주감옥에 수감됐다.

김복희는 미결수로서 2개월 보내고 재판을 통해 징역 2개월을, 한연순은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실제 미결수 기간까지 포함하면 김복희는 4개월, 한연순은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김복희의 복역기간에는 이설이 있다. ‘우리 어머니-김복희 장로의 일생’은 김복희의 며느리 김광신이 정리한 책인데 여기서는 김복희가 1년감 복역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하지만 재판기록과 김복희 본인이 작성한 편지에는 2개월을 선고받고 2개월의 미결수 생활까지 4개월을 복역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연순보다 한 달 먼저 출감한 김복희의 증언에 의하면 수감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일제당국의 가혹한 처우로 짐승이나 먹을 정도로 열악한 음식을 먹었고, 여자들에게는 감옥내 공창으로 데려가 삼을 삼게 하는 강제노역도 강요당했다.
김복희는 당시 백암리 봉화시위에 30여명의 남자들이 참여했지만 여성은 김복희 자신과 한연순 뿐인데 체포된 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여성 두 사람이고 남자들은 헌병분견소에 가서 30~60도의 태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두 여성이 주동자로 파악된 결과였다. 한데 염치면 수형자가 명부가 실전돼 당시 태형 을 받은 남자들이 몇 명인지, 또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복희는 4개월 수형 후 이화학당의 전문학교 보육과에 진학해 졸업하고, 사에리시 여사의 강경 황금정여학교 부속유치원 설립에 참여하고, 강경 만동여학교의 교사, 공주 대화정교회의 영명여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영명여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925년 전재풍 목사와 결혼하고, 전 목사의 목회지를 따라 강원도를 거쳐 1934년에는 경기도 화성군의 천곡교회에서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모델인 최용신의 뒤를 이어 강습소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