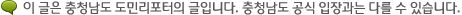

밭에 서서 대숲의 바람 소리를 듣는 내가 무협영화의 고수가 된 기분이었다. 어찌나 듣기 좋던지.
나무를 심던 삽을 놓고 대숲으로 들어가 보았다.
순간 ‘이럴수가’ 하는 탄성이 나왔다. 너무 시원하고, 마치 어느 아늑한 별스런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도시인들이 대체로 휴식이라 하면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낚시, 잠 자는 것 등이다. 또한 휴식이 아닌 1주일 정도의 휴가라고 하면 여름에 푸른 바닷가, 산, 계곡, 혹은 어디 그럴싸한 해외여행을 꼽을지 모르지만 여름 휴가가 아닌 평일에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느낌의 휴식이자 여행이었다.
대숲 체험에 여행이라는 단어까지 끼워 넣기에는 슬그머니 겸연쩍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긴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계속되는 매연과 소음 속에서 일에 파묻혀 살다가 고향 집에 내려와 혼자만의 이런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나만의 즐거움이고 너무나 편안한 휴식이었다. 시원한 청량음료 같은...
굽이치듯 구부러진 코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우거진 대나무 숲을 지나치면서 삼림욕을 하는 것이다.
마디마다 튼실한 모양에 꼿꼿한 기상마저 간직한 대나무는 적당한 굵기와 간격으로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에 대나무 숲 속을 걸으며 적잖은 상념들에 젖어 보았다.
우리가 어릴적에 만난 대나무들.
공부 안하고 해찰 피우다가 지엄하신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 그때 당신이 드셨던 매가 대나무 뿌리였다. 어찌나 아팠던지.
굵기가 큰 대나무는 붓통으로 쓰이고 필통이 되기도 했다. 또한 고풍스런 전통 찻집에서는 녹차잎을 건져 내는 다기로 활용했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대나무는 대금 소금 피리 같은 악기도 되었고, 무기가 빈약했던 오래전에는 죽창으로 쓰이기도 했다.
어릴적에 아주 큰 실수를 해서 ‘오늘 난 죽었구나’하면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꾸중 대신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왕대 밭에서 왕대 난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됐지만 어머니는 나의 성장통을 이해 하시고는 잘못을 덮어 주시면서 반성의 기회와 함께 믿음도 주셨던 것이다.
대나무는 5월쯤에 죽순이 나오는데 다른 다년생 나무들이 겨울을 뺀 나머지 기간동안 꾸준히 자라는데 비해 이건 죽순이 나오자마자 50일 이내에 다 자라버린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두터워지지도 않으며 오로지 단단해지기만 할 뿐이다.
그게 대나무의 지조라면 지조인 것이다.
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꼿꼿하게 자라는 대나무는 어쩌면 우리네 삶과 비슷한것 같다.
무수히 많은 세월을 살면서 나와 내 이웃 모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얼굴 모습과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똑같은 것은 누구나 혼자 살수 없이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웃처럼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나는 타인에게 대금이나 피리 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주는 향기로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죽창이 되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지나 않았는지 되묻게 된다.
혹은 배고픈 누군가에게 따끈한 국밥 한그릇 퍼 담아 줄 죽통 한그릇의 역할이라도 했을지.
‘스스스스’ ‘파스스스’ ‘스스스삭’
여전히 봄바람에 일렁이는 대나무의 잎사귀 부딪치는 소리는 대숲을 걷는 내게 많은 생각과 반성을 갖게 한다.
살아 가면서 더 나누고 배려심 있고 아량을 베푸는 삶이기를 스스로 다짐해 본다.